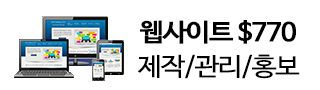[칼럼] 미국은 더 이상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다
제가 처음 미국으로 이사한 1999년만 해도 미국은 자유시장이 번성하던 곳이었습니다. 비슷한 가치를 지닌 상품과 서비스를 유럽에서 살 때보다 더 싼값에 살 수 있었죠. 2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미국이 자유시장이 번성하고 있다고 말하면 아마 비웃음을 살 겁니다. 인터넷 요금, 통신비, 비행기 푯값 등 당장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과 서비스 가격만 보더라도 미국 소비자들이 유럽, 아시아 소비자들보다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월간 요금은 프랑스가 31달러, 영국은 39달러인 반면 미국은 68달러입니다. 통신요금도 미국이 프랑스나 영국보다 두 배 더 비쌉니다.
자유시장이 번성하지 못하고 소멸한 건 다분히 미국이 시행한 경제 정책의 결과입니다. 1999년 미국은 경쟁을 뚫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자유시장이었고, 반대로 유럽은 독점은 아니더라도 몇몇 기업이 분야별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과점 체제에 가까웠습니다. 경쟁은 없고, 있더라도 미미했죠. 항공 업계가 좋은 예입니다. 지난 20년간 미국 항공사들은 인수·합병을 거듭했고, 항공사 수는 줄었습니다. 반대로 유럽은 라이언에어(Ryanair)나 이지젯(Easy Jet) 등 저가 항공사들의 진입을 허용해 시장의 경쟁을 촉진했죠. 미국 규제 당국이 시장에서 경쟁이 약화될 수도 있는 인수·합병을 별다른 제약 없이 쉽게 허용하는 사이 유럽 규제 당국은 저가 항공사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관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역전된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소비자들이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자유시장이라는 아이디어를 미국에서 보고 배웠다는 사실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다른 아이러니가 있다면, 미국의 좌파 정치인들이 (유럽을 보고 배우자며) 주장하는 정책 가운데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도 대단히 극단적인 정책이 많다는 점입니다. 유럽 사람들 가운데 의료보험 회사는 악마이므로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지만, 부자 증세가 수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해줄 특효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론하는 대상에 대해 정확히 모른 채로 토론하다 보면 정치적인 견해가 양극화되기 쉽습니다. 유럽 시장과 사회, 규제 당국의 역할을 바라보는 미국 정치인들의 주장에도 유럽에 대한 무지가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진보 진영 혹은 좌파들이 유럽을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노동자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는 이상향으로 그릴 때면 그들이 묘사하는 유럽이, 제가 태어나 살던 유럽이 맞나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보수 진영 혹은 우파들은 아직도 유럽을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복지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동력도, 혁신도 없는 그런 생동감 없는 유럽은 이미 옛날에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유럽을 상정해놓고 그런 유럽을 배우자, 또는 반면교사로 삼자고 내놓는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기 딱 좋은 위험한 일이죠.
유럽을 볼 필요도 없이 당장 미국 시장을 봐도 경쟁을 저해하고 자유시장의 엔진을 꺼버린 대가를 슬슬 치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로비와 정치자금 관련 법은 미국 선거와 정치 과정을 ‘머니 게임’으로 만들어버렸고, 그 결과 미국 시장은 점점 더 독점 시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법안을 만들어 제정하는 일은 너무 어려운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입법과 행정 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으로 바꿔낸 기존 주류 기업들은 규제 당국을 압박해 경쟁사의 등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억제합니다. 전도유망한 기업이 나타나면 일찌감치 인수해버리고, 규제 기관에 꾸준히 로비를 해서 경쟁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될 틈을 없앱니다. 선거철이 되면 많은 돈을 쏟아부어 원하는 후보를 당선(혹은 낙선)시키고, 원하는 정책을 기어이 관철해내죠. 예전 같으면 자유시장 경제를 보장하는 경쟁 촉진 법안이 상대하고 넘어서야 하는 기존 독과점 지향 기업들이 통신회사, 제약회사 등에 그쳤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훨씬 더 강력하고 새로운 독과점 기업들이 법안의 길목을 막고 서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고 독점 시장에 가까워진 대가는 미국 소비자들이 곧바로 치르고 있습니다. 독점으로 인한 효용 손실은 미국 한 가계당 한 달에 300달러에 이릅니다. 독점으로 인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모두 다 고려해 계산에 넣으면 미국 노동자들이 경쟁이 저하됨으로써 받지 못하는 노동 소득은 매년 총 1조 2,500억 달러에 이릅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지금의 체제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유럽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현재 유럽 시장이 채택한 제도는 사실 적잖은 부분 시장 경쟁의 원칙을 먼저 도입한 영국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프랑스나 독일의 규제 당국이 기업이나 시장의 로비에 맞서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경쟁을 보장하는 심판이자 감독 기관의 역할을 원래부터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회원국이 모여 구성한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 경쟁위원회(EU DG Comp)는 그 역할을 보란 듯이 해냈습니다. 유럽연합 산하 기관이나 부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규제 당국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잘한 덕분에 유럽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Brexit)가 유럽의 경쟁 정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유럽연합이 경쟁이 보장되는 자유시장 원칙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국은 유럽 단일시장의 일원으로서 누리던 혜택을 모두 잃게 되겠죠. 전문가들이 대개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잃게 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을 규제 당국이 감독하고, 그 규제 당국을 시민이 감시함으로써 소비자는 필요한 보호를 받고, 독과점 기업의 등장이 자연히 억제되는 선순환 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유럽의 규제 당국을 배우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도 불과 몇 년 전을 떠올려보면 아이러니입니다. 유럽연합이 특히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강력히 보호하는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제정하자, 전문가들이 이를 두고 혁신을 가로막는 전형적인 유럽식 과도한 규제라고 비웃던 것이 불과 2년 전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너무나 쉽게 도용되고 아무런 보호를 받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되자, 2년 전에 GDPR을 조롱하던 그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미국에도 비슷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반독점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몸서리를 치던 이들이 이제는 미국도 독점 기업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현실적인 반독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유럽의 법안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디언, Thomas Philippon)
원문보기
*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의 토마 필리폰(Thomas Philippon) 교수가 가디언에 쓴 칼럼입니다. 필리폰 교수는 IMF가 선정한 45세 이하의 젊은 경제학자 25명에 뽑혔고, 최고의 유럽 경제학자에게 주는 베르나세르상(Bernácer Prize)을 수상했습니다. 최신 저서로 <대전환: 미국은 어쩌다 자유시장을 버렸는가>가 있습니다.
ingppoo / Newspeppermint
<Copyright © US BUSINESS NEWS TV, Unauthorized reproduction and redistribution prohibited>
Managing Editor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