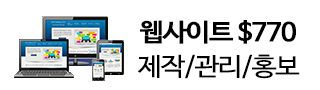[시] 鄕愁
♥ 鄕愁 ♥
아는체 모르는체
또 그러히 계절은
우리들 곁을 지나가는군요
덩그러니 떨구어진 고향역
아는 체하는 향나무에 눈 짓하고
풀랫폼을 걸어 나오면
칠 벗겨진 그때 그 벤치 두 개
철길 나란한 아지랭이에
눈을 희롱하며 걷던 신작로하며
게으른 산등성이 넘자고
수풀 속으로 들어서면
찌르르 휘 휘리리릭 튕겨지는
방아깨비의 화려한 날개 짓
성긴 수풀 사이로
희끗희끗 바래진 단청으로
어린 가슴을 부여잡던 곳 집 하며
갈 바닥엔 어느새 벼 낫가리가 쌓일테고
이윽고 밑둥 잘린 논 바닥에
눈처럼 뽀오얀 서리 나리면
호호 마주 불던 산마루엔
토깽이 발자욱이 어지럽겠지요
빌딩 모서리를 돌아서니
달려드는 도시의 삭풍 한자락
산골 떠난 소쩍새의 두고 온 鄕愁

<Copyright © US BUSINESS NEWS TV, Unauthorized reproduction and redistribution prohibited>
Managing Editor 기자 다른기사보기